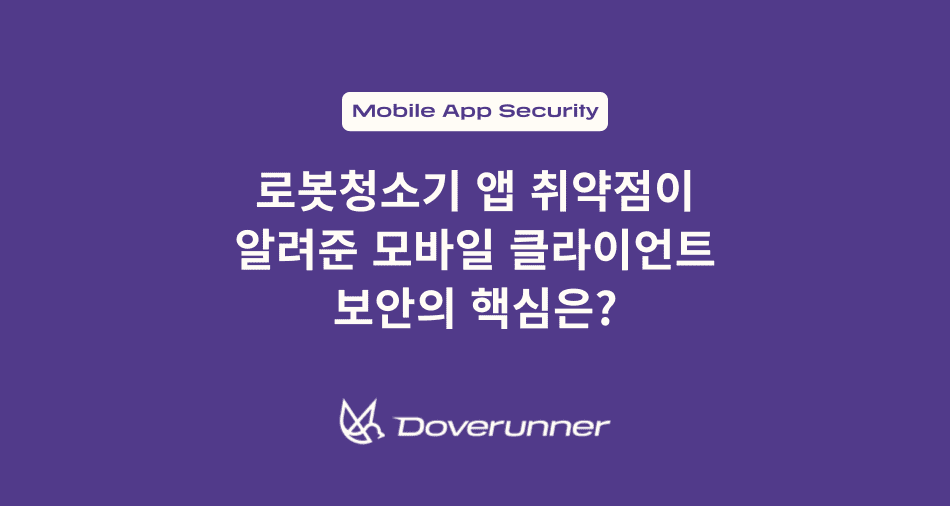2025년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로봇 청소기 보안 점검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 제품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 절차가 부실해 외부인이 카메라에 접근하거나 내부 사진이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확인된 것인데요. 표면적으로는 IoT 기기 보안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보안 구조의 허점에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전제품 앱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 OTT, 핀테크, 헬스케어 등 사용자 단말에서 실행되는 모든 서비스 앱이 직면한 공통된 리스크가 됩니다.
클라이언트 앱 보안이 서버 보안보다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이유
모바일 서비스의 첫 관문은 항상 클라이언트입니다. 아무리 서버가 철저하게 보호돼 있어도 앱 자체가 변조되거나 인증 정보가 탈취되면 보안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OWASP Mobile Top 10 2024에서도 전체 모바일 공격 중 약 60%가 클라이언트 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커는 서버보다 단말 내부에서 더 손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토큰을 평문으로 저장하거나 무결성 검증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앱이 실행될 경우 사용자의 계정, 결제 정보 등이 한 번에 노출됩니다. 로봇 청소기 앱에서의 인증 실패 사례는 이런 구조적 위험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무 관점에서 점검해야 할 클라이언트 보안 5대 항목
1. 인증과 세션 관리 강화
모바일 인증은 보안 체계의 출발점이자 가장 빈번하게 공격 받는 부분입니다. 액세스 토큰을 평문 상태로 저장하거나 장기간 유지하는 구조는 루팅, 탈옥된 기기에서 손쉽게 탈취될 수 있습니다. 토큰은 반드시 OS가 제공하는 보안 키 저장소(Keychain, Keystore) 에 암호화해 저장하고, 일정 주기마다 토큰 회전(Token Rotation)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로그인 시마다 새로운 세션 ID를 발급하고 IP, 디바이스 식별값을 세션에 바인딩해 세션 고정 공격을 방지해야 합니다. API 요청에는 토큰을 헤더로만 전달하고 로그에 기록되지 않도록 미들웨어 단계에서 필터링해야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API 키·JWT 시크릿·OAuth 클라이언트 ID 등의 민감 정보가 코드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적 분석(SAST)과 비밀 탐지 도구를 자동화 파이프라인에 연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증과 세션 관리를 강화하면,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첫 방어선을 확실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앱 무결성 검증
앱이 배포된 이후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무결성 검증은 클라이언트 보안의 핵심입니다. 안드로이드의 Play Integrity API, iOS의 App Attest를 통해 앱 실행 시점의 서명과 환경 정보를 서버로 전달하면 위조된 앱이나 에뮬레이터 환경을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앱 내부에는 해시 검증, 서명 확인, Dex 코드 체크 같은 로직을 추가해 코드가 수정되면 자동으로 실행을 중단 시키거나 제한 모드로 전환하도록 구성합니다. 이와 함께 빌드 파이프라인에 서명 검증, 해시 산출, 정적 분석 자동화 단계를 포함하면 배포 과정의 무결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런타임 보호(RASP)
정적 보호만으로는 동적 공격을 막기 어렵습니다.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자가 보호(RASP)는 앱이 실제 실행되는 순간 발생하는 후킹, 디버깅, 메모리 조작, 코드 인젝션을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대표적인 공격 툴은 Frida, Magisk, Xposed, GameGuardian 등이 있으며, 이들은 게임이나 금융 앱의 로직을 변조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RASP는 이러한 라이브러리 로딩이나 디버거 연결을 감시하고 의심 활동이 탐지 되면 앱을 종료하거나 API 요청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고급 RASP 솔루션은 동적 메모리 암호화, 가짜 환경 생성 등을 통해 공격자의 분석 시도를 혼란시키는 능동 방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처럼 클라이언트 로직이 많은 환경에서는 매크로나 자동 입력을 통한 치팅을 실시간 탐지해 공정성과 매출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권한 최소화 설계
앱이 불필요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할수록 보안 위험은 커집니다. 권한은 필요한 시점에만, 필요한 만큼만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기 실행 시 일괄 권한 요청 대신 기능 사용 직전에 지연 요청을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권한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Android 14. iOS 17 이후부터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AndroidManifest.xml이나 Info.plist에 선언된 권한 중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제거하고, SDK·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요청하는 권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권한 설계는 단순한 보안 절차를 넘어, 사용자 신뢰 확보와 개인정보 규제(GDPR, PIPA, CCPA 등) 대응의 핵심 요소입니다.
5. 민감 데이터 암호화
모든 민감 데이터는 전송과 저장 전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HTTP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로컬 DB, 캐시, 로그에 남는 사용자 정보나 결제 토큰은 반드시 AES-256 또는 ChaCha20-Poly1305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합니다.
통신 구간에서는 인증서 핀닝(Certificate Pinning) 으로 중간자 공격을 방지하고 TLS 1.2 이상 버전만 허용해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디버그 로그에 개인 정보가 남지 않도록 필터링하며 Crash 리포트에도 토큰, 계정 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로그아웃이나 계정 삭제 시에는 보안 삭제(Secure Delete) API를 호출해 데이터를 완전히 제거하고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에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감 데이터 암호화는 단순히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서비스의 평판, 컴플라이언스, 브랜드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이번 사건이 던진 모바일 앱 보안 시사점
로봇청소기 앱 취약점은 결국 앱 실행환경의 보안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서버는 보호되고 있었지만 클라이언트 단의 인증 검증이 없었고, 세션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권한 요청이 과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모바일 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위험 구조입니다.
게임이나 OTT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공격이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변조된 앱을 통해 매크로나 자동 결제 우회가 이루어지고, 해킹된 단말에서 콘텐츠가 무단 복제되는 식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앞으로의 보안 전략: 실행 중 위협을 막는 런타임 보호 중심
지금까지의 앱 보안은 코드 난독화나 암호화 등 정적 보호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행 중(런타임) 공격은 정적 보호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앱이 실제로 실행되는 순간 발생하는 메모리 조작, 디버깅, 후킹, 무결성 우회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자가보호(RASP)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런타임 보호는 단순히 해킹을 막는 기능이 아니라, 앱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사용자 경험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반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보안 설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보안이 곧 품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도브러너(구. 앱실링)는 이러한 런타임 보호(RASP) 기술을 코드 수정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실행 환경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변조, 후킹, 매크로 등 클라이언트 위협을 차단해 개발 리소스 소모 없이도 앱 무결성과 사용자 신뢰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